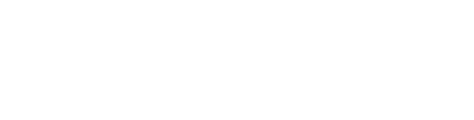몸집이 큰 소와 말은 물을 많이 먹는다. 사막의 지표에는 물이 보이지 않지만 지하수는 많이 있다. 사막 곳곳에 우물 관정이 있다. 이 우물은 영하 삼십도가 넘는 혹한에도 얼지 않는다. 이 물을 소와 말에게 먹이고, 사람도 식수로 사용한다.
관정의 모터를 돌려 물을 개수대로 퍼내면, 소와 말들이 몰려와서 물을 먹는다. 그런데 소는 말에게 약자다. 그래서 목동들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말을 몰아낸다. 말들이 관정에서 멀리 떨어지면 소들이 와서 물을 먹는다. 소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하나 둘씩 물러나면 모터사이클을 돌려 돌아온다. 그러면 아도(말)들이 돌아와 소를 몰아내고 물을 차지한다.
관정 가까운 곳에 사는 둘째가 소와 말을 돌본다. 오늘은 둘째 게르에 온 가족이 모였다. 둘째집 안주인은 전병을 겹쳐 기름에 튀긴 빵을 잘 만든다. 이 빵을 ‘간빙’이라고 부른다. 식탁에 간빙을 내 놓자 모두들 맛있게 먹는다. 이들 가족은 어느 게르에 머물던 모두 함께 식사를 한다. 그리고 어제 잡은 고기도 여기로 가져와 보관한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다.
고기를 얻을 소를 잡으러 트럭을 몰고 들판으로 나갔다. 바트가 올가미를 단 막대를 들고 뛴다. 소를 걸려는데 소 걸음을 따라 잡지 못한다. 할 수 없이 소들을 우리에 몰아넣은 다음에야 성공할 수 있었다.
이백킬로가 넘는 큰 가축은 양이나 염소처럼 죽일 수 없다. 머리에 올가미를 걸어 끌려 나온 소를 게르에서 좀 벗어난 들판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다리에 줄을 걸어 소를 넘어뜨린다. 소가 넘어지면 예리한 칼로 목의 기도를 자른다. 흐르는 피는 바가지로 받아 들통에 담는다. 기도에서 피가 흐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가 고통에 몸부림친다. 고통을 줄여주려고 심장을 찔러 소의 숨이 멎게 한다. 소와 말은 큰 체격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면서 죽는다.
소와 말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양처럼 매달아 해체할 수는 없다. 사막의 맨 바닥에서 해야 한다. 먼저 가죽을 분리해 편다. 가죽이 몸통을 해체하는 장판이 된다.
가슴 앞 덥게 뼈를 제거하고, 내장을 분리한다. 그리고 가슴 뼈, 갈비 뼈, 뒷다리, 앞다리 순으로 해체한다. 대략 한 시간 정도 되니 작업이 끝난다.
몽골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는 ‘아도 마흐(말고기)’다. 오늘 아도를 두 마리나 잡았으니 게르에는 성찬이 벌어진다. 안주인이 고기와 내장을 함께 삶아 식탁에 내놓는다. 이들이 식사하는 방식은 각자 칼을 들고 고기를 베어 먹는 것이다. 먼저 주인이 함지의 고기를 들어 잘라 먹은 후, 옆 사람에게 돌린다. 차례로 고기를 작은 칼로 잘라 손으로 집어 먹는다. 수저나 포크는 사용하지 않는다. 아도 마흐를 익힐 때 고기가 끓는 국물에 밀가루 전병을 넣어 같이 익힌다. 그러면 밀가루 전병에 아도 기름이 스며들면서 중국집 꽃빵처럼 익는다. 아도 마흐를 이 빵에 싸서 먹으면 훌륭하다. 그리고 아도 마흐는 식어도 딱딱해지지 않고 부드럽다. 아마 말기름의 특성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몽골인들은 아도 마흐를 별미로 여기는 것 같다.
무려 삼일동안 생명이 죽는 것을 보았다. 처음 보았을 때는 잔인함과 섬뜩함을 느꼈다. 지금 너무 많이 봐서 무디어졌나. 그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가축을 죽이는 것은 단순하게 먹거리를 얻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쌀을 얻기 위해서 벼를 베고, 김치를 담기 위해서 배추를 뽑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둘 다 다른 생명에게서 먹거리를 얻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 우리가 산다. 한 생명에서 다른 생명으로 유기체와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일 뿐이다. 육신을 죽이는 것을 살육이라고 한다. 섬뜩한 말이다. 여기서 이런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잡는다고 한다. 몽골인은 ‘아바흐’, 얻는다고 말한다. 삶의 한 부분이니까 그냥 추수 정도로 여기면 되겠다.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