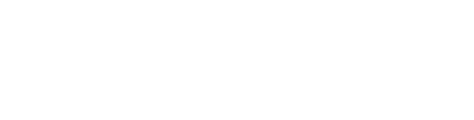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
9월은 몽골인들이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달이다. 긴 방학을 지나고 학교가 개학한다. 기관에도 사람들이 돌아와 일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로 시끌벅적해야 할 학교운동장이 조용하다. 한글 교실에 오는 아이들이 학교에 수업이 없어서 가지 않는다고 한다. 아직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되지 않아서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궁금해서 인터넷 뉴스를 보았더니 공무원과 교사들의 임금인상이 IMF의 승인이 나지 않아 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있다. 그래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일종의 파업을 하고 있다. 추분으로 들어가는 9월은 날씨 변화가 심하다. 바람의 방향이 남에서 북으로 갑자기 변하고, 세기도 빨라졌다. 하지만 9월 하순은 코이카 일정과 추석나기 가족 여행이 겹쳐서 사막에서 나와 울란바타르와 아르항가이에서 보냈다. 그래서 고비의 9월을 절반밖에 알려주지 못하게 되었다.
9월 5일(수)
출근길에 찬바람에 몸이 떨린다. 벌써 가을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하나. 바람도 많이 빨라졌다. 서울보다 십여일은 빠르게 가을이 오고 있다. 어제 숙직한 롭슨이 기관 앞 정원 나무 밑에 떨어져 있는 마른풀과 낙옆을 치우고 있다. 벌써 풀이나 나무들이 여름 내 영양을 공급해줬던 잎을 떨궈내고 있다. 어느새 들판도 푸른빛이 사그라들었다. 서리가 내리지 않았는데도 여기 식물들은 준비를 서두른다.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디기 위함 일 것이다.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유전적 내림이다. 저녁이 되자 집 앞의 하일라스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 북쪽에서 구름이 몰려오고 모래 바람이 인다. 초속 20미터 정도의 강풍이 분다. 여름 지나고 처음 맞는 바람이다. 이제 고비에 혹독한 시련의 계절이 오고 있다.
하루 만에 가을이 왔다. 창 너머 푸르렀던 들판은 어느새 누렇게 변해 있다. 들의 풀은 겨울 준비를 이미 다 한 듯하다. 옷장에서 지난 봄에 입었던 양복을 내려 입었다. 집 앞에 나오는데 찬바람이 다리에 휘감긴다. 사람들은 11월이 될 때까지는 여기는 따뜻하다고 하는데, 바람은 어느새 변하였다. 몽골 서부의 알타이와 읍스는 이미 눈이 왔다고 한다. 이제부터 시련을 감내해야 하는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9월 10일(월)
어제는 하루 종일 정전이었다. 정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TV, 인터넷은 물론 세탁도 안 된다. 전기로 모든 걸 하는 구조에서 정전은 치명적이다. 고비의 시골 게르에서는 전기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편하게 사는 도시에서만 전기에 매달린다. 한낮에 따뜻한 남풍이 불었다. 바람의 세기가 조금만 세져도 모래 바람이 일어난다. 숙소에 가는 동안 모래가 사정없이 온몸을 때리고 지나간다. 저녁에 바람이 좀 자는가 싶더니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북쪽의 찬 공기가 몰려온다.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내면서 거대한 한랭전선을 만들고 있다. 한밤중에 사막에 번개와 천둥이 작렬한다. 번개 불빛에 사막에 순간 조명이 들어 온다 그리고 어둠에 잠긴다. 마치 스타워스에 나오는 외딴 행성의 모습이다. 이어서 천둥과 함께 폭풍우가 창을 때린다. 연이어 내려치는 번개 불빛에 좀체 잠이 들지 않는다.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이 깬다. ‘아 내가 잠이 들었었구나’ 안심하고, 다시 잠을 청한다.
9월 17일(월) 현장사업 심의위원회 참석차 수도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번에는 가족 방문과 겹쳐 짐이 많다. 그래서 이스타나 뒤 세자리 모두 차지하기로 하고 요금을 세배인 6만 투그릭을 주었다. 고비의 들판은 아직 푸른빛이 남아 있다. 이 풀은 서서히 말라 겨우내 양과 염소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막 샤인샨드를 벗어난 지점에서 아차하고 두고 온 것이 생각났다. 집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하는 물건인데 야단났다.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오간다. 이대로 차를 돌릴까, 아니면 내일 심의위원회 마치고 밤기차로 내려갔다 올까. 그러다가 노선버스 화물이 생각났다. 샤인샨드와 울란바타르를 오가는 버스는 하루에 한번 1시 반에 출발해서 9시 넘어 도착한다. 양방향 출발과 도착 시간은 같다. 롭슨에게 집에 있는 물건을 찾아 버스 화물로 부쳐달라고 전화했다. 다행히 화물이 버스에 실려 무사히 왔다. 탁송료 3,000투그릭을 주고 찾아 왔다. 이런 오지에도 사람이 사는 방법은 있다.
9월 21일(금) 울란바타르는 3일째 눈비에 젖어 있다. 어느새 여기는 겨울이 왔다. 어제 경량패딩 차림으로 나갔다가 추워서 혼났다. 아홉 시간 후면 아내가 온다. 가슴은 떨리는데, 불안이 엄습한다. 지금 이 시간처럼 아내가 보고 싶은 적이 있었던가.
9월 25일(월) 벌겅 아이막의 ‘일승 다사르해’에 갔다. 모래를 일스라고 한다. 다사르해는 단편이나 조각을 의미하니까, 초원에서 모래가 많이 있는 한 조각의 땅이라는 의미이다. 거대한 ‘흐긍 한 올(산)’ 아래 넓은 습지가 마른 후에, 퇴적된 모래가 바람에 날려 언덕을 만든 곳이다. 관광 가이드들은 여기를 미니고비라고 부른다. 울란바타르에서 가까워 푸르공으로 세시간 정도면 올 수 있다. 넓게 펼쳐진 듄을 볼 수 있고, 사막 놀이 모래 썰매를 즐길 수 있다. 고비사막의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곳은 고비와는 오백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몽골 서북부의 벌겅 아이막이다. 여기서 푸제의 친구인 울란나스크의 게르에서 하루를 묵었다.
드디어 우리 가족만 남았다. 게르 밖에서 저녁을 하고 있는 동안 드디어 용순의 장기가 들어나기 시작한다. 무려 십개월 만에 아내의 잔소리와 참견 속에 묻힌다. 아내 말소리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들으니 이것도 좋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제지한다. “그만 좀 해”, “얘는 말도 못하게 해” 순간 아내 얼굴이 굳어진다. 조용한 시간에 아들을 불러 엄마 말 좀 들어주면 안돼겠느냐고 물었다. “스트레스 받자나, 그러니까 아빠 빨리 와” 이 녀석은 이제까지 나를 엄마 방패로만 여겼다. 이제부터는 엄마를 네가 챙겨야 한다고 설교를 하니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다.
9월 29일(토)
돌아서는 길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았다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떠다녀 견디기 어렵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리 저리 걸음을 뗀다
아내가 일어나 따라 온다 왜 화장실만 자꾸 가느냐고 채근한다 꼭 잡아주는 아내 손이 따뜻하다 뭐라 말이 나오지 않는다 아내 어깨 붙잡고 자리로 갔다
드디어 맨트 나오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선다 디파쳐로 들어가는 아내 모습이 갸날프다 마지못해 손 흔드는 아내를 보려는데 눈가가 흐려진다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나도 이제 늙었구나
다들 보내고 혼자 돌아섰다 쓸쓸한 방으로 혼자 들어 가야한다 괜찮냐며 어깨 집는 푸제 손이 무겁다 행여 울음이 샐까봐 아무 말도 못했다
보름 지난 달이 늦은 밤 하늘을 오른다 달님도 내 맘 처럼 한 구석이 무너졌구나
오늘 밤 어찌 자나 푸제 보내고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든다 저린 가슴에 위안이 될까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