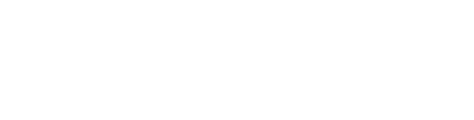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
코이카 단원이 이동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코이카 규정이란다. 이는 봉사자 신분에 어울리는 처신과 비용절감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규정이라는 덫에 걸려 한 치도 움직이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여지가 없다.
우리가 샤인샨드로 이동하는 날이 몽골 최대 명절인 차강사르 전날이다. 울란바타르에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불어난 짐 까지 있다. 가지고 가야 될 이사짐이 백 킬로가 넘는다. 이걸 모두 노선버스에 실어줄 수 있느냐고 몇 번 물었는데, 그 때마다 코디는 자신있게 대답했다.
사건은 터미널에서부터 터졌다. 울란바토르 남부 아우토스 보달은 국방부 인근에 있다. 데미가 짐을 스타렉스에 실고 가고, 우리는 승용차로 이동했다. 투무르가 짐을 차에 실고 올테니 식사하고 있으라며 한식당 앞에 내려 준다. 식사 마칠 무렵 투무르가 들어왔는데 대답이 안 좋다. 짐이 너무 많다며 버스 기사가 실어주지 않는단다.
식사 마치고 터미널에 갔다. 버스가 낯이 익다. OJT 마치고 울란바토르로 돌아올 때 타고 온 버스다. 엘지 디스플레이 로고가 붙어 있고, 버스 안에 한글 문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아마 구미나 파주에서 엘지 TV 만드는 노동자들 실어 나르던 차였을 것이다. 중고차로 여기 까지 밀려와 남은 생을 살고 있다. 주변에 다른 노선 버스들도 보니 모두 그런 식이다. 우리 나라처럼 대중교통의 공통적인 표시도 없고, 버스마다 노선 안내판도 각자 제멋대로다. 여기는 과거와 현실이 공존한다. 버스표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판매하고, 이동자의 신원 까지 관리하는 정보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데 버스 운영은 거의 내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것보다 못하다. 기사 혼자 승차 점검하고, 화물까지 관리한다. 더구나 버스를 이용한 택배까지 있다. 물건을 보낼 사람들은 기사에게 받을 사람이 기다리는 장소를 써 주고 요금을 낸다. 버스는 오백킬로 이상의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화물 받을 사람이 있는 곳에 정차해서 화물을 인계해주고 떠난다. 광활한 벌판에서 듬성듬성 떨어져 사는 이들이 물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다. 몽골에는 아직 전문 택배 회사는 없다. KGB가 들어와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장사하고 있지만. 우체국을 통한 택배도 집까지 배달해주지 않는다. 택배가 도착하면 전화로 알려준다.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받아온다.
우리는 짐을 내려서 버스 앞에 가지고 갔다. 화물칸을 열어보니 가득 차 있다. 짐이 하나도 들어갈 여유 공간이 안 보인다. 투무르가 기사하고 협상을 하는데 전혀 풀리지 않는다. 혈기 왕성한 데미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왔나보다. 갑자기 둘이 우격다짐을 하기 시작한다. 기사가 주먹을 내지르는 것을 손으로 막으며 기사를 붙잡았다, 부랴부랴 둘을 떼어 놓았다. 투무르가 짐을 샤인샨드에 가는 빈차를 찾아 실어보낼테니 우리 둘은 버스에 오르란다. 할 수 없이 짐을 하나도 실지 못하고 버스에 올랐다. 차가 막 출발하려는데 투무르가 버스를 제지하며, 케리어 두 개를 버스 안에 밀어 올린다. 아까 싸울 때는 싸울 때고, 살살 웃으면서 기사를 달랜 모양이다. 최소한 짐 한 개는 실어 주어야 될 거 아니냐고. 아무튼 백 킬로 쯤 가다 화물칸이 비니까 우리 캐리어를 화물 칸에 밀어 넣었다. 나머지 화물은 그들이 아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샤인샨드에 가는 차를 물색해서 보낸단다. 출발하고 나서 전화로 물으니 다행히 차가 있어서 보냈으니 걱정 말란다. 이들의 능력에 감탄한다. 27살 밖에 안 되는데, 우리 나라 애들 같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능력은 환경이 만든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능력이 생긴다.
음녁 설은 농경국가에서 최고의 명절이다. 설이 되면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설이 되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다가오는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몽골의 설은 차강사르라고 한다. 아직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이곳의 차강사르는 상당히 성대하다.
버스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자로 보이는 일단의 청년들이 우리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가는 동안 보드카를 마시면서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고 있다. 샤인샨드의 중간 쯤인 차이르를 지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 청년이 나에게 말을 건다. ‘아찌 아찌’ 한다. 그러면서 내 옆의 이선생을 가리키면서 와이프냐고 묻는다. 그러면서 엄지척을 한다. 한국의 늙은이가 젊은 처녀를 거느리고 가는 모양이 아니꼬운 듯 했다. 아니라고 손을 저으면서 ‘어흥’이라고 했다. 취한 청년은 계속 시비를 건다. 급기야는 몸을 내 안 쪽으로 기울이며 이선생에게 시비를 건다. 그를 밀쳐내며 그만 하라고 했다. 잠시 후 말이 거칠어진다. ‘아찌, 야, 씨바’한다. 충돌 직전 까지 왔다. 그의 동료들이 말리려고 애쓰는데,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청년은 막무가내다. 보다 못해 내 뒤의 승객이 만류하자 그와 싸움이 붙는다. 팔에 문신 가득 그린 그 청년은 취해서 객기를 참지 못한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억눌린 욕구를 발산할 때 나오는 증상이다. 아무튼 이 녀석과 더 엮이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애는 나를 돌발시키려고 애 쓴다. 앞뒤로 돌아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몸을 부딪친다. 그리고 말을 건다. 전혀 응대하지 않고, 앞만 보는 수 밖에 없다.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어려워진다. 말도 안통하고 경찰이 온다 해도 자국민 우선인 몽골 경찰이 내게 잘 해줄리는 없다. 대사관에서 경찰영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자기에게 연락하라던 당부가 떠오른다. 아무튼 불안 속에 두 시간 이상을 버티고 가야 한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걸치려던 그 청년이 버스가 속력을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나동그라진다. 이제는 기사와 시비가 붙는다. 행패부리던 녀석도 기사에게는 안 되는 모양이다. 둘이 숙덕거리더니 청년은 자리에 앉는다. 얼마 후 버스는 무사히 샤인샨드에 도착했다. 마중 나온 기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2년 동안 살아야 할 집으로 들어 갔다. 설 전날 귀향도 아니고, 객지로 가는 길이 이리 힘 들 줄이야.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