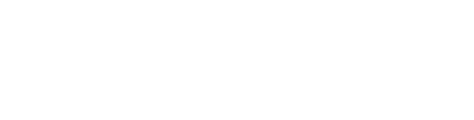현지 적응 교육 중에 파견예정지에 일주일간 다녀오는 일정을 OJT라고 한다. 1월 25일 샤인샨드에 갔다가 수요일인 1월 31일에 울란바타르로 돌아 왔다. OJT의 목적은 파견예정 기관 사전 점검과 숙소 물색이다. 이 기간 동안에 파견 기관에 들러 인사하고, 2년 동안 묵을 숙소도 구해야 한다. 25일 아침에 랜트한 SUV 차량으로 권 코디와 솔롱거, 이선생 넷이 샤인샨드를 향해 출발했다. 뿌연 울란바타르의 오타를 뚫고 나오니 시원하다, 명색이 고속도로인데 왕복 2차선이다. 도시 외곽으로 빠져 나오니 오가는 차량이 적어 시속 70km 이상 속력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저속 차량이 앞에 있으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서 추월을 한다. 맞은편에오는 차량이 없으면 다행인데, 도시를 멀리 벗어나기 전에는 통행량이 많아 아슬아슬한 곡예를 한다. 울란바타르에서 약 100km 정도 까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아스팔트가 파손된 곳이 많아 차량이 속력을 내지 못한다. 몽골은 도로를 거의 외국 차관으로 건설하였다. 경제 사정이 나빠 도로 유지에 예산 배정하기는 어려운 모양이다. 시 외곽을 벗어나 한 시간 정도 가니, 점점 오가는 차량이 보이지 않고, SUV가 쌩쌩 달린다. 멀리 지평선 너머 길에 햐얀 신기루가 깔린다. 점점 사막 분위기가 나타난다. 들판에 눈은 사라지고, 누런 땅이 그냥 드러나 있다. 겨우내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단다. 여기서 부터는 일년 내내 하늘에서 물 몇 방울 떨어지지 않는 사막이다.
두 시간 정도 지나자 멀리 도시가 보인다. ‘초이르’라는 도시다. 지도에서 보면 울란바타르와 샤인샨드 중간 쯤에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 격인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점심을 했다.
샤인샨드는 울란바타르에서 남쪽으료 5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샤인샨드는 모래 언덕이 빙 둘려져 있는 분지에 자리잡은 도시다. 분지 외곽에 철도가 지나간다. 철도역 부근을 외 샤인샨드, 분지 안쪽은 내 샤인샨드라 한단다. 더르너고비 인구가 68,000명이고, 샤인샨드는 12,000명 정도이다. 샨드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더니 물 이란다. 샤인은 샌(сайн)이니까 좋은 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이 사막에 왠 물이냐고 했더니 아주 오랜 옛날에 여기가 바다였단다. 고비가 완전한 골격을 갖춘 디노사우루스 화석이 발견된 지역이니까 평원이었을 것이고, 여기는 낮은 지형으로 바다였던 셈이다. 지질학적인 의미로 도시 이름을 지었다.
도시에 들어서니 내가 묶을 민박집 주인이 승용차로 기다리고 있다. 그 차를 따라가 민박집에 갔다. 주인은 교육문화예술국 회계 담당 직원인데, 키가 건장하고 몸집이 좋다. 긴 코트에 장화 신고, 뚜벅뚜벅 가는 모습이 북방의 러시아 여성처럼 강인해 보인다. 아파트에 들어서니 방으로 안내하며, 여기를 사용하란다. 그런데 침실이 하나 밖에 없다. 식구가 3명이라고 했는데, 하나 밖에 없는 침실을 나에게 주면 다들 어디서 자나? 앞에 집이 하나 더 있나? 온갖 생각이 다 든다. 그런데 나중에 숙소 물색할 때 다녀보니 대부분의 아파트가 거실 하나에 침실 하나다. 겨울이 길고, 난방이 어려운 이곳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게르 하나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몽골인들의 생활 습관으로는 이런 아파트가 어색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손님인 내가 안방 차지하고, 주인들은 모두 거실에서 기거 했다. 거실 벽에 머르호르, 한쪽에 말안장이 보인다. 주말이면 시골집에 가서 말을 탄단다. 여기도 우리처럼 시골집은 늙은 부모가 지키고, 젊은이들은 도시에서 편하게 산다. 주인이 자기 이름을 소개한다. 뭐라 하는지, 몽골인들은 이름이 길어서 따라 부르기 어렵다. 그랬더니 ‘침게’라고 부르란다. 그들도 이름 부르기 어려우니까 두자나 세자로 줄여서 부른다. 나중에 코이카에서 우리를 안내하는 투무르에게 물으니 신분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이상 모두 편하게 줄인 이름을 부른단다.
주인이 전기 냄비에 몽골 만두인 보츠를 넣고 스위치를 올린다. 잠시 후에 보츠 한 접시를 담아주며 먹으란다. 몽골말은 간단하다. ‘타 이드흐 호’, ‘너 이거 먹어’ 다. 그리고 양 내장 순대를 꺼내 썰어준다. 냄새가 고약하다. 보츠는 그런대로 참고 먹을 수 있다. 양 내장 순대를 목에 넘기려니 보통 고역이 아니다. 이럴 때 소주라도 있으면, 그런데 이게 간식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녁이었다. 아무튼 이 날은 고픈 배를 끌어 안고, 잠을 청했다.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