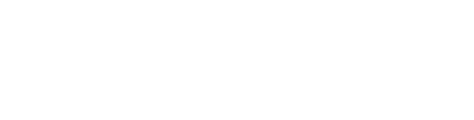초원과 사막의 나라 몽골에서 숲길 산책 이야기하면 좀 쌩뚱맞은가. 그렇지만 울란바타르에 아주 멋진 낙옆송 숲길이 있다. 낙옆송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가는 가을에 ‘복드항 산’ 숲길을 소개한다.
울란바타르를 가로 질러 흐르는 톨강 아래에 병풍처럼 울란바타르를 감싸고 있는 산이 ‘복드항 올’이다. 복드는 몽골 불교에서 성육신한 성자이다. ‘한’은 영어로 Khan 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칸 이라고 한다. 하지만 키릴문자로는 Хан 으로 표시되고, 몽골인들은 한 이라고 하는데 뒤에 연음이 따라오면 ‘항’으로 발음한다. 올 은 산이니까 ‘복드왕 산’이라고 해야 정확한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복드산이라 해서 적합하지 않다. 고유명대로 ‘복드항 올’이나, ‘복드항 산’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징기스칸 광장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가면 고가도로가 나온다. 기차 철로와 남쪽 길, 그리고 하수로 오염된 작은 냇물 셀비강을 건너는 ‘평화의 다리’다. 이 다리를 건너면 오른쪽에 ‘복드한 어르동(복드 왕 궁전)’을 끼고 번화한 사거리가 나온다. 사거리 남쪽은 울란바타르에서 속칭 강남으로 불리는 ‘자이승’ 구역이고, 바로 앞은 ‘어르길’ 이라는 동네다. ‘어르길’은 정상이나 봉우리를 뜻한다. 복드항 산을 바라보는 곳이라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다.
어르길 동네를 지나 몇 백 미터 만 가면 폭이 넓고 유량이 제법 많은 톨강이 나온다. 톨강은 몽골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강이다. 기본적으로 몽골은 강을 신성시하여 강물에 사람이나 가축, 자동차 등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톨강 가 양 쪽 둔치는 관목이 빽빽하게 자라는 원시림이 자리잡고 있다. 폭이 좁게는 5m, 넓은 곳은 수십미터가 넘는 둔치에 보르까스(버드나무와 비슷함) 나무와 관목이 무성하다.
몽골 정부는 강가의 둔치를 개발하지 않고 있어서 둔치로 내려가는 길은 없다. 하지만 제방 옹벽의 완만한 곳을 타고 내려가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꽤 있다. 다리 끝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내려가면 키가 5m 넘게 훌쩍 큰 보르까스 숲을 만난다. 그리고, 숲 사이로 사람들이 다녀서 난 오솔길, 맑은 물이 찰랑대며 흘러가는 강물, 은빛으로 빛나는 강돌이 보인다.
강가 풀밭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햇빛을 즐기다 오솔길로 들어간다. 햇빛도, 바람도, 자동차 소음도 나뭇잎에 부서져 강물처럼 고요하다. 적막을 즐기고 싶으면 한 두 시간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좋다. 하지만 오늘 목적은 여기가 아닌지라 둔치에서 나와 길을 간다.
자이승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꺽어지면 독립지사 이태준 선생 기념 공원이 있다.
의사인 이태준 선생은 몽골 근대화 시기에 울란바타르에서 인술을 베풀고,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보탬을 준 분이다. 공원의 기념관에 가면 그분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공원 앞에 변성암 덩어리가 불쑥 솟은 땡 뫼가 있다. ‘복드항 올’의 정혈로 보여 지는 자리다. 여기에 몽골국의 전승기념탑이 있다.
몽골국은 1919년에 독립하여 2차 대전에 참전했다. 러시아와 연합으로 일본 관동군의 항복을 받아낸 전승국이다.
기념탑에는 전쟁과 몽골 근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원형 벽화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한 옆에는 주요 전투에서 숨진 무명용사의 비도 있다.
하지만 지금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복드항 산’ 개발금지구역이다. 자이승 사거리에서 직진으로 사거리를 건너 이삼백미터 올라가면 ‘하이스(ХААИС)’라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허더(시골) 아즈(삶) 아호잉(생활) 이흐(대) 소르고일(학교)’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오르막길 끝자락인 정류장 부근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마치 서울 근교의 산 밑 풍경과 비슷하다. 다른 것은 서울의 산 밑에는 중년 이상의 사람들이 등산복 차림으로 모여 있고, 여기는 학생과 젊은이들이 간편복 차림으로 서성대고 있는 것이다.
준비를 마친 무리는 길을 따라 올라간다. 오르막길을 1킬로미터 조금 넘게 가니 주차장이 있고, 리조트 숙소들이 보인다. 지도에는 ‘복드항 올 리조트’로 나오는데 요즘 이용을 안 하는지 잡초만 무성하다. 아마 폐쇄된 것 같다.
이 산은 1994년에 몽골 정부에서 자연보호구역인 ‘개발 금지 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하였고, 1996년도에는 유네스코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가장 높은 봉우리는 해발 2286미터인 ‘체체 궁(봉우리)’이다. 이 산은 586 종류의 식물의 터전이고, 52 종류나 되는 숲속 생물의 보금자리다.
자연보호구역인데도 안내소나 특별한 시설물은 보이지 않는다. 입구에 금지사항 표지와 등산로 안내판만 있을 뿐이다.
산자락 잔디밭에는 사람들이 가족, 직장 단위로 피크닉을 즐기고 있다.
학생들은 학급, 동아리, 친한 애들 끼리 올라간다. 한 패의 선생님이 되게 소심해 보인다. 긴 줄을 풀어 아이들에게 줄을 잡고 가라고 한다. 애들이 뒤쳐질까 걱정인가 보다. 애들은 떼 뭉쳐 가니 즐겁다. ‘아카라치’와 비슷한 응원가를 목이 터져라 부른다. 반가인 모양이다. 내가 십여 년 전 한참 담임 할 때 아이들과 같이 도봉산 오르던 생각이 난다.
한 떼의 고딩들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있는 대로 틀어 놓고 디스코 음악을 쿵쾅거리며 간다. 시험 걱정없이 맘 껏 노는 여기 아이들이 조금은 부럽다. 엄마는 아이들을 몰고 가고, 아빠는 꼬마 손잡고 간다. 더러 스틱을 집고 가는 중년도 있다. 우리는 아차산만 가도 히말라야 갈 것 같은 대단한 등산복 차림이 즐비한데 여기에는 아직 없다.
좋은 것이 하나 있다, 장사꾼이 없다. 산 밑에 음식 파는 식당도 없다. 물론 산중에 하드 장사, 막걸리 좌판도 없다. 그리고 오르는 사람들이 거의 아이들인지라 산속에서 술내도 안 난다.
이상한 것이 하나 있다, 무리마다 배구공을 하나씩 들고 간다. 산길 오르는데 저게 왜 필요할 지 궁금하다.
엠티비 자전거를 메고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다. 바퀴에 모터를 달아 붕붕거리며 올라가는 청년도 보인다. 이들은 고생과 낙을 맞바꾸는 사람들이다. 높은 곳에서 하강할 때 느끼는 속도감과 스릴은 어디 비길 바가 없을 것이다.
수령이 수십 년도 더 되어 보이는 낙옆송 숲은 9월 말인데 이제 막 단풍이 들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계절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해를 잘 받는 쪽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숲에 갖힌 나무는 아직 푸르다.
숲길에는 사람 손으로 만든 것들이 없다. 로프 팬스, 철 계단, 나무 잔도 등 산행 길을 짜증나게 하던 것들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덕분에 산은 깨끗하다.
경사가 십도 정도 되는 완만한 오르막길, 변성암 부서진 자잘한 너덜, 사람 발길에 패여 드러난 나무 뿌리들, 오랜만에 산길 걸으니 좋긴 한데 힘이 팽긴다.
오래된 낙옆송이 쓰러져 누운 곳이 휴식터다. 아이들이 일자로 쭐러리 앉아 쉬고 있다. 산 아래 안내판에는 쉼터가 세 개 있다고 써 있다. 대략 삼십분마다 한 번씩 쉬라고 쉼터를 안내하는 것이다.
계곡을 따라 오르는 산길에 냇물이 제법 흐른다. 물가에 자리 잡고 눌러 앉은 가족들이 보인다. 그런데 산행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다. 몽골 사람들은 등산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여긴 딴판이다. 여자 아이들이 지쳐서 허덕대면서도 악착같이 올라간다.
한 번도 쉬지 않고 두어 시간 산길 걸어 올라왔으니 힘이 다 빠진다. 경사가 완만해졌다. 날망에 거의 다 온 것 같다. 힘내 걸으니 저쪽에서 함성 소리가 들린다. ‘군대가 있나?’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드디어 고개 마루다. 낙옆송 숲이 확 걷히고 환한 벌판이다. 어림잡아 이삼천 평은 넘어 보이는 광장이다. 여기 지명이 ‘바론(오른쪽) 쉬레(상)’다. 고개 마루가 평평해서 이런 이름을 붙였다. 등산로는 여기까지다. 고개 마루 양쪽 능선은 숲이 빽빽하여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
광장 가운데 독수리 조형물이 있고, 사람들은 군데군데 모여 동그라미 배구를 하고 있다. 몽골에서 배구를 ‘가르(손) 범버그(공)’라고 한다. 몽골은 겨울이 길고 바람이 많아서 야외 운동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체육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배구를 많이 한다. 내가 사는 생샨드 아이들도 그늘만 지면 배구 놀이다. 몽골 아이들의 배구 실력은 대단하다. 조그만 아이들도 둘이 토스를 마주 하면 보통 열 번 이상은 한다.
돗자리라도 가져 왔으면 자리 깔고 일광욕이라도 하련만 아무 준비 없이 왔으니 뱅뱅 돌다 내려가는 수 밖에 없다. 산 밑에 내려오니 시간이 훌쩍 지났다. 산행 시간이 거의 대여섯 시간은 된다. 이 정도면 하루 산행 운동량으로 충분하다.
몽골 여행은 시간에 많이 쫓긴다. 이동 거리가 길고, 도로 사정이 나쁘기 때문이다. 점을 여러개 찍어야 직성이 풀리는 패키지 여행에서 이런 숲길 산책은 어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몸과 마음의 쉼이다. 울란바타르의 자이승은 멋진 곳이다. 여기서 이삼일 정도 일정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 하루는 이태준 선생을 만나고, 전승기념탑에 올라 붉은(울란) 거인(바타르)을 바라보며 야만의 시대를 되돌아본다. 그리고 다음날 숲길 걸으며 힐링하면 몸과 마음에 새 기운이 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톨강 둔치의 보르까스 숲길 같은 풍경도 어디 가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