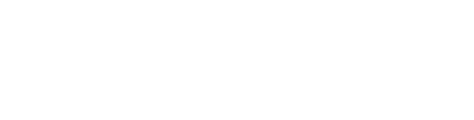몽골 사람들은 돌과 암석을 종류 구분하지 않고 모두 ‘촐로’라고 한다. 우리는 크기나 모양에 따라 바위 돌이나 자갈, 한자어까지 더해지면 말이 많아진다. 몽골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 종류의 사물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 부르지 않는다. 대체로 한 단어로 여러 상태를 뭉퉁그려 말한다. 이런 표현의 단순화 현상이 몽골어에서 더러 발견된다. 이는 유목민들의 생활 습성과 비슷하다.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은 가재도구가 단순해야 하고,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이 쓰는 말도 이렇게 닮아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
고비사막에서 암석층이 융기되어 지면에 돌출된 지대는 동쪽 더르너고비의 달랑자르갈란 솜에서 서쪽 돈드고비의 델게르처흐트 솜까지 광대한 면적에 걸쳐 있다. 맨 동쪽에 있는 ‘이흐 나르틴 하드’는 약 4만 3천 헥타에 달하고, 그 서쪽에 있는 ‘이흐 가자린 촐로’는 3만 5천 헥타 정도이고, 가장 서쪽에 있는 ‘바가 가자린 촐로’는 300헥터 정도로 규모는 가장 작다. ‘바가’는 작다이고, ‘가자르’는 땅, ‘촐로’는 암석이니 작은 구역의 암석지대라는 뜻이다. 그런데 울란바타르에서 만달고비로 가는 길에서 접근이 가장 편리해서 ‘바가 가자린 촐로’를 여행 가이드들이 선호한다.
‘바그 가자린 촐로’는 울란바타르에서 230킬로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 아침에 울란바타르를 출발하면 점심쯤에 델게르처흐트 솜에 도착할 수 있고, 여기서 서북쪽으로 사막길을 37킬로 미터 정도 가면 ‘바가 가자린 촐로’가 나온다.
‘바가 가자린 촐로’에 들어서면 큰 바위 옆에 ‘누딘 라샹’이라는 작은 간판이 나온다. ‘누드’는 눈이고, ‘라샹’은 치료소이다. 그러니까 ‘눈 치료소’다. 커다란 암반 중간쯤에 지름이 10cm가 안 되는 작은 샘 구멍이 있다. 가이드가 샘에 조롱박을 넣어 물을 떠 눈을 씻으라고 한다. 신기하게 시야가 환하게 밝아진다. 그는 물을 마시지는 말고 눈 만 씻으라고 한다. 샘물에 눈을 좋게하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누딘 라샹’에서 계곡 바닥을 가로질러 북쪽 벽으로 가면 작은 숲이 나온다. 숲에는 냇물이 가로지르는 도랑이 있고, 그 위에 몇 개의 집터가 있다. 폐허가 된 작은 사원이다. 3백년쯤 전에 두 명의 수도승이 각각 도랑이 가로지르게 집을 짓고, 집에서 나가는 물을 받아 차와 음식을 만들어 생활했다고 한다. 이들은 명상하며 집필을 많이 하였고, 나중에 높은 지위의 승려가 되었다. 나중에 이 사원은 사람들이 찾는 유적이 되어 ‘러번참빈 사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사원터에서 내려오면 언덕 아래에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는 입구가 작은 동굴이 있다. ‘행복의 동굴’이라는 암반 사이에 있는 이 동굴은 깊이가 18m 정도 되고, 아래쪽으로 경사지어 내려가다가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롭슨이 굴을 따라가다가 수직 부분에서 멈추고 돌아섰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게르(집) 하드(암석)’라는 큰 바위에 흉노 시대 암각화가 있고, 그 시대의 무덤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가이드는 이걸 알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암각화가 희미해졌거나, 후에 낙서로 덮혀졌나 해서 흔적을 찾아보았으나 허사다.
멀리 몽골인들이 집회하는 모습이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모두 전통복장이고, 샤만 제사장도 보인다. 아마 전통 제례를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 한 남자가 와서 촬영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한다.
좋은 구경거리 놓치고 ‘바가 가자린 촐로’를 나올 수 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고비의 관광포인트에는 큰 나무가 거의 없고, 엔간한 시설도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햇빛을 피해 쉴만한 곳이 없다. 작은 타프 하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하니 그냥 길을 가는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몽골 여행은 고난의 연속이다. <저작권자 ⓒ 소금바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몽골생할 많이 본 기사
|